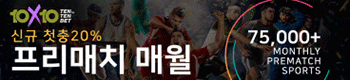직장동료와의 짧은 인연..
작성자 정보
- youtube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75 조회
-
목록
본문
아직도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워낙 여자심리에 어둡기 때문에.. -_-; 하지만 이제 꽤 세월이 지나 그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로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회상이나 해보려고 합니다.
7년쯤 전인가, 아직 미혼이던 저는 모 회사에 입사 3년차의 영계 사원으로 열심히(???) 근무중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남직원 10명 여직원 1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순진한데다 숫기가 좀 부족한 성격탓에 저는 여직원들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군요. 그저 열심히 술만 마시고 다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_-
그러던 어느날,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우연한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친하던 부서 선배, 그 선배와 친하던 여직원 둘이 멤버였고, 저는 말하자면 짝맞추기 용으로 그 자리에 초대되었던 셈이죠. 소주 맥주로 술자리 정석을 밟은 후 우리는 당시에 막 생기기 시작하던 노래방 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평소에는 여직원들과 변변한 대화도 나누지 않던 저도 그날만큼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약간은 서먹한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12시가 다 되어서 파했고, 저는 그 가운데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여직원 하나를 집에 모셔다주라는 임무를 선배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뿔뿔히 흩어지고 이리저리 택시를 잡으려 뛰는 사람들 사이에 둘이 남겨질 때까지도 저는 정말 그 여자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데려다주고 나도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밖에는... 약간은 취한 듯한 그녀를 뒤에 세워두고 목이 쉬어라 목적지를 불러대고 있던 저는, 갑자기 등뒤에 느껴지는 뭉클하는 감촉에 헉하고 숨을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뒤에서 갑자기 저를 껴안은 거죠. ^^; 순진무구하기만 하던 저는 그저 마구 당황해하면서 '왜 이래요 xx씨, 정신차려요.' 같은 식은땀 나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 취했는지 어땠는지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저를 끌어안은 팔을 풀지 않더군요. 저는 더더욱 당황해서 (이구...) 그녀를 얼른 집에 배달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가당치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_-;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태웠는데, 그녀의 애정표시(?)는 택시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람을 계속 당황시키더군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술자리에서 특별히 나랑 눈이 맞은 것두 아니고, 이 여자 내가 알기로 분명히 애인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장교로 복무중이던 애인과 냉전중인 상태였음) 그런데 묘한 건, 제가 뭐 숫총각도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몸매 하나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에서 내려 그녀의 아파트까지는 컴컴한 골목길을 제법 걸어야 하는데, 그녀는 숫제 제 팔에 매달려 가더군요. -_- 뭐가 즐거운지 뭐라고 뭐라고 혼자 재잘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_-; <- 이런 얼굴로 적당히 맞장구를 쳐가면서 그녀를 들다시피 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 입구!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T.T
'자, 다 왔으니 이제 들어가요...'
이제 살았구나, 그녀의 어깨를 슬쩍 밀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나랑 마주선 그녀는 집에 들어갈 자세를 취하기는 커녕,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살며시 내 가슴에 기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느꼈던 건 그녀의 샴푸 냄새와 화장품 냄새... 흔히 총각 시절에 '여자냄새'라고 느낄 바로 그 체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자제력이랄까... 뭐 그런 것이 핑하고 끊어져 날아가는 것을 느꼈죠. 바로 다음 순간 우리는 서로 입술을 포개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안 서로의 혀를 괴롭히면서(?) 끌어안고 있던 우리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한 저의 유도로 좀 으슥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의 부모로부터 불과 10여미터 떨어져있었을 그 벤치에서 제 손은 그녀의 이곳저곳을 아무런 거침없이 헤집었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를 힙겹게 비집고 들어가보니, 그녀는 어느새 많이 젖어있더군요. ^^; 그 순간 마지막까지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무는 그치지 않았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어느 새 시계바늘은 새벽 세시를 가리키더군요. 그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는 불과 두어마디...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빙충맞게도 내뱉은 '그런데... 너 애인있다며?'였습니다. -_-;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군요...) 그녀는 당근 아무 대답이 없었고... 12시 조금 지나서 집앞까지 도착한 그녀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새벽 세시 반... 어떻게 어떻게 집에 돌아간 저는 말똥말똥해진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고민아닌 고민을 하느라 가뜩이나 모자란 수면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래도 나누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추천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님다. -_-)
7년쯤 전인가, 아직 미혼이던 저는 모 회사에 입사 3년차의 영계 사원으로 열심히(???) 근무중이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남직원 10명 여직원 1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순진한데다 숫기가 좀 부족한 성격탓에 저는 여직원들과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군요. 그저 열심히 술만 마시고 다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_-
그러던 어느날,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우연한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친하던 부서 선배, 그 선배와 친하던 여직원 둘이 멤버였고, 저는 말하자면 짝맞추기 용으로 그 자리에 초대되었던 셈이죠. 소주 맥주로 술자리 정석을 밟은 후 우리는 당시에 막 생기기 시작하던 노래방 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꽤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되는군요. 평소에는 여직원들과 변변한 대화도 나누지 않던 저도 그날만큼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약간은 서먹한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12시가 다 되어서 파했고, 저는 그 가운데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여직원 하나를 집에 모셔다주라는 임무를 선배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뿔뿔히 흩어지고 이리저리 택시를 잡으려 뛰는 사람들 사이에 둘이 남겨질 때까지도 저는 정말 그 여자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나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데려다주고 나도 가서 쉬어야지 하는 생각밖에는... 약간은 취한 듯한 그녀를 뒤에 세워두고 목이 쉬어라 목적지를 불러대고 있던 저는, 갑자기 등뒤에 느껴지는 뭉클하는 감촉에 헉하고 숨을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뒤에서 갑자기 저를 껴안은 거죠. ^^; 순진무구하기만 하던 저는 그저 마구 당황해하면서 '왜 이래요 xx씨, 정신차려요.' 같은 식은땀 나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고, 그녀는 정말 취했는지 어땠는지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저를 끌어안은 팔을 풀지 않더군요. 저는 더더욱 당황해서 (이구...) 그녀를 얼른 집에 배달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가당치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_-;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택시를 잡아 태웠는데, 그녀의 애정표시(?)는 택시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사람을 계속 당황시키더군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술자리에서 특별히 나랑 눈이 맞은 것두 아니고, 이 여자 내가 알기로 분명히 애인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장교로 복무중이던 애인과 냉전중인 상태였음) 그런데 묘한 건, 제가 뭐 숫총각도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몸매 하나는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에서 내려 그녀의 아파트까지는 컴컴한 골목길을 제법 걸어야 하는데, 그녀는 숫제 제 팔에 매달려 가더군요. -_- 뭐가 즐거운지 뭐라고 뭐라고 혼자 재잘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_-; <- 이런 얼굴로 적당히 맞장구를 쳐가면서 그녀를 들다시피 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 입구!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T.T
'자, 다 왔으니 이제 들어가요...'
이제 살았구나, 그녀의 어깨를 슬쩍 밀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나랑 마주선 그녀는 집에 들어갈 자세를 취하기는 커녕, 약간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살며시 내 가슴에 기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느꼈던 건 그녀의 샴푸 냄새와 화장품 냄새... 흔히 총각 시절에 '여자냄새'라고 느낄 바로 그 체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자제력이랄까... 뭐 그런 것이 핑하고 끊어져 날아가는 것을 느꼈죠. 바로 다음 순간 우리는 서로 입술을 포개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안 서로의 혀를 괴롭히면서(?) 끌어안고 있던 우리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한 저의 유도로 좀 으슥한 벤치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의 부모로부터 불과 10여미터 떨어져있었을 그 벤치에서 제 손은 그녀의 이곳저곳을 아무런 거침없이 헤집었습니다. 꽉 끼는 청바지를 힙겹게 비집고 들어가보니, 그녀는 어느새 많이 젖어있더군요. ^^; 그 순간 마지막까지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무는 그치지 않았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어느 새 시계바늘은 새벽 세시를 가리키더군요. 그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는 불과 두어마디...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빙충맞게도 내뱉은 '그런데... 너 애인있다며?'였습니다. -_-;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군요...) 그녀는 당근 아무 대답이 없었고... 12시 조금 지나서 집앞까지 도착한 그녀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새벽 세시 반... 어떻게 어떻게 집에 돌아간 저는 말똥말똥해진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고민아닌 고민을 하느라 가뜩이나 모자란 수면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래도 나누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추천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님다. -_-)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