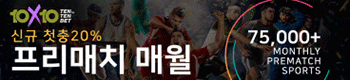옛날 얘기 하나.
작성자 정보
- youtube링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67 조회
-
목록
본문
그 전에 군대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꿈 같은 얘깁니다.
당시 12월 중순 쯤이었는데, 지방의 집에 있다가 인천에 살던 학교 여자친구를 보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딴에는 그녀에게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려고 갔던 것이었는데, 그 먼델 그녀 때문에 갔다고 말하는 것이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서 그저 다른 볼일 때문에 왔노라고 그녀와 얘길하다보니, 엉뚱하게도 그녀에게서 자기가 좋아하는 당시 같은 동아리에 있던 녀석의 얘기만 잔뜩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나보고 그 쉐이한테 잘 말해달랍디다.
허- 이런....
아- 당시의 느꼈던 처참함이란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모를겁니다.
성질이 더러운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 걸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시간 10분 전 도착 10분 후 까지만 기다리는 게 당시의 내 생활 신조였지요.
그래 그 추운 겨울날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며 그녀와 만나기로 한 커피숍 앞에 30분 전에 도착하고 괜히 밖에서 서성대다가 딱 10 분 전에 들어선 나의 정성에다가 물을 끼얹어도 분수가 있지, 하여간 쪽팔린 기억은 오래 남는다고 그 때의 처참한 기억이 지금도 가끔은 무덤에서 걸어나오곤 하지요. 각설하고...
요즘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당시엔 인천터미널 주변에 Yellow House 쪽 말고도 포장마차가 죽 늘어서서 술 한잔 때우기는 그만이었지요.
그래 거기 포장마차에 앉아서, 막차 시간까지 시펄 시펄하며 혼자서 처량하게 소주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술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돌게 하는 건 똑같잖았던 지라, 신세가 더럽게 됐다는 생각에 화풀이로 중간에 수원에서 내려 창녀집에서 배설을 하고 갈까, 아니면 막차라서 시간이 안돼니까 천안엘 가서 배설을 할까, 벼라별 생각을 하다가 얼핏 잠이 들었다가 비몽사몽간에 상상의 나래를 폈지요.
당시 수원이나 천안의 소위 쭉집이라 부르던 창녀집에서 쑈탕-짧은 거-하는데 사천원씩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내 주머니엔 딱 3천원만 남아있던 터였고 어찌하면 천원을 깍을까 하는 궁리를 하다가 어차피 안됀다는 걸 알기에 엉뚱한 쪽으로 빠진거지요.
'쭉집엘 갔는 데 이 시펄 것덜이 천원을 이대로 그냥 집으로 걸어가는 데 어떤
눈 먼 보지가 하나 앞에서 걸어오는 거야.
주))눈 먼 보지 : 당시 친구들 사이에 은어로 그냥 밤길 헤매다가 아무나 데리고 가서
잘 수있는 그런 여자를 가리킴.
그런 여자 찾는다고 거의 매일 밤 술먹고 거릴 헤매곤 했음.
그래 내가 다가가서
/이봐. 어딜 그렇게 혼자서 가는거야. 여자가?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 눈 먼 보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처량하게.
/아저씨. 나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와 재워주께.
그리고는 3천원이면 자고 갈수 있는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기냥 박아대는 거지.
음. 흐흐... 좋군.
아줌마면 더 좋은데..... 살도 좀 있고....
얼굴은 상관 없다. 내가 그건 봐준다.
좀 뚱뚱 해도 상관없다. 그것도 봐준다. 그러나 색은 잘 써야 됀다. 왜냐? 영자
-딴 놈한테 잘 말해달라던 학 교 여자 친구 이름-물론 가명- 년 대신에 따먹는 거니
까.'
등등의 상상을 하며 천안에 내렸는데 -당시엔 터미널이 역전 근처에 있었음- 거의 11시가 다 돼 있었고 무지하게 춥더만요. 바람은 또 왜그리도 불던지...
소위 삐끼하는 할머니덜이랑 천원만 깍자고 실갱이하다가 거절당하고, 에이 씨 친구네 자취방 가서 술이나 푸자고 터덜터덜 걷는 데 눈보라까지 치더만요. 그게 기억으론 첫눈이었는데 완전 영화처럼 눈보라가 치더군요.
와- 정말 돌겄습디다.
근데 에잉-? 앞에서 왠 여자가 하나 눈보라 속을 걸어오고 있습디다. 웬 보따리를 잔뜩 움켜쥐고 걸어오는 데 아무 생각없이 그 앞으로 가서 말했지요. 앞에 왔는 데 보니까 서른 중반은 돼보이는 아줌마더군요. 이여자가 이 추운데 집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 식당일 끝나고 집에 가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순간에는.
/어이 아줌마. 이 추운데 이딜 그렇게 혼자 가는거여? 했더니.
/응? 나 갈 데가 없어. 하대요. 그래서
/따라와. 내가 재워 주께. 하고 내가 가던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랬더니 멀끔이 서서 안따라오대요. 그래 그 옂 쪽으로 가서 그녀가 잔뜩 품에 안고있는 보퉁이를
잡아 끌었지요.
/아- 그거 따라오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하며 훽 보퉁일 잡아당기니까 쑥 뺏기더니 못이기는 체 따라오며 보따리 달라고 하대요.
/가서 주께. 하고는 약 오분 쯤 떨어져 있던 완전 허름한 여인숙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쭉집이 4천원에서 십원도 안깍아주는데 3천원짜리 방이면 여러분덜 대충 상상이 가시지요.
이불 밖으로 얼굴만 나오게 하고 입김 후-하고 불면 허옇게 서리는 그방에서 정말이지 내 평생 잊지못할 떠거운 오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나야 혈기 왕성한 이십 초반이었던 데다가 술까지, 그것도 열받아 먹은 깡소주로 독이 올라있던 상태였으니 그렇다 치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도 정말이지 어지간 합디다.
사실 그렇게 오입을 잘하는 여자는 타고난다더만 정말이지 그런 여자였습니다. 주인여자가 와서 문 두드릴 정도였으니 대충 짐작은 가시겄지요.
버스안에서 술기운에 상상 속에서 그렸던 상황이 그대로 이뤄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타고난 호색인 내가 지금도 손가락에 꼽으리만치의 떠거웠던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하튼, 그 떠거웠던 사실적 묘사는 훌륭한 필력의 작가분들께 넘기기로 하고 옛날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
그럼 20,00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